2025. 5. 2. 11:12ㆍ대한검정회한자익히기/대사범
폭군이 된 마지막 왕 – 상나라 주왕 이야기
『史略』 중 商紂王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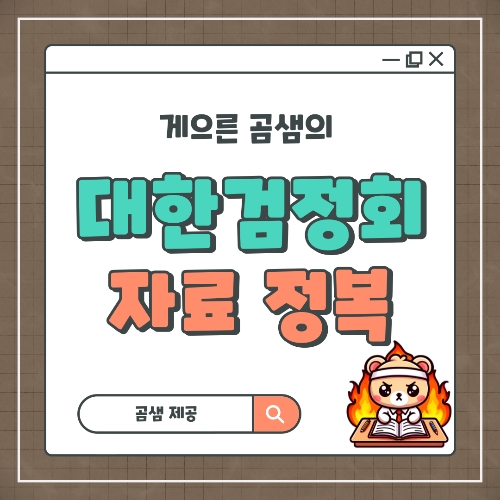
1. 출전 소개
『사략(史略)』은 원나라의 사가 송렴(宋濂)이 편찬한 사서로, 고대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사건과 인물을 간결하게 정리한 통사적 성격의 책입니다. 아래 구절은 상(商)의 마지막 왕 주왕(紂王)의 방탕과 폭정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2. 원문 · 독음 · 해석
原文
歷太丁 帝乙하고 至帝辛하니 名은 受오 號為紂라 資辯捷疾 手格猛獸 智足以拒諫 言足以飾非 始爲象箸하니
箕子歎曰 彼爲象箸어늘 必不盛以土簋 하고 將為玉杯로다 玉杯象箸면 必不羹藜藿하고 衣短褐하고 而舍茅茨之下하여
則錦衣九重과 高臺廣室하리니 稱此以求면 天下不足矣라 紂伐有蘇氏하니 有蘇以妲己로 女焉이라 有寵하야
其言을 皆從이러라 厚賦税하야 以實鹿臺之財하고 盈鉅橋之粟하며 廣沙丘苑臺하고 以酒為池하고 懸肉為林하야
爲長夜之飲하고 諸侯有畔者면 紂乃重刑辟하야 為銅柱하고 以膏塗之하야 加於炭火之上하고 使有罪者로
緣之하야 足滑跌墜火中이면 與妲己로 觀之大樂하고 名曰 炮烙之刑이라 하더라
해석
태정과 제을을 거쳐 제신에 이르니, 이름은 수(受)요, 호는 주(紂)라 하였다.
말재주가 뛰어나고 동작이 민첩하며, 손으로 맹수를 때려잡고, 지혜로 간언을 막을 수 있으며, 말로 허물을 꾸밀 줄 알았다.
그가 처음으로 상아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箕子)가 탄식하며 말했다.
“저 상아 젓가락을 쓴다면 진흙 그릇에는 담지 않을 것이요, 반드시 옥잔(玉杯)을 만들 것이며, 옥잔과 상아 젓가락을 쓰면
이제는 쑥갓국(藜藿)은 먹지 않고, 짧은 헝겊옷을 입고 초가집에 살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비단 아홉 겹 옷을 입고, 높은 누대와 넓은 집을 추구하게 될 터이니, 이런 식으로 구한다면 천하라도 부족할 것이다.”
주왕은 유소씨를 정벌하였고, 유소는 달기(妲己)를 바쳤다.
달기는 총애를 받아 그녀의 말이라면 모두 따랐다.
중과세로 녹대(鹿臺)의 재물을 채우고, 거교(鉅橋)의 곡식을 가득 채우며,
사구(沙丘)의 원대(苑臺)를 넓히고 술로 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루어 밤새도록 잔치를 벌였다.
제후 중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주왕은 무거운 형벌을 만들어 동기둥에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올리고,
죄인을 그 위로 걷게 하여 발이 미끄러져 불 속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 모습을 달기와 함께 보고 즐거워하였는데, 이를 포락지형(炮烙之刑)이라 하였다.
3. 어휘 풀이
帝乙, 帝辛: 상나라 말기의 군주들. 제신이 곧 주왕.
象箸: 상아로 만든 젓가락. 사치의 상징.
玉杯: 옥으로 만든 잔
藜藿(여확): 들나물. 소박한 식사
短褐, 茅茨: 헌 옷과 초가집. 검소한 생활
鹿臺, 鉅橋, 沙丘: 궁전과 창고, 별장
炮烙之刑: 기름 바른 쇠기둥 위를 걷게 하는 잔혹한 형벌
4. 어법 설명
A而B 구조는 대조나 결과를 강조합니다.
以: “~을 가지고 ~을 삼다”라는 의미의 전형적인 고문 형식.
則 A, 稱此以求 B, 天下不足: 원인과 결과, 조건의 논리적 전개.
5. 관련 고사성어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이이제이(以夷制夷): 야만으로 야만을 제어함 (달기를 통해 세력을 얻음)
포락지형(炮烙之刑): 잔혹한 형벌의 대명사
6.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시사되는 점
사치와 폭정의 말로는 몰락이라는 교훈을 상왕 주왕의 이야기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정치, 일상생활에서도 탐욕과 과시욕은 위기를 부릅니다.
작게 시작된 사치 하나(象箸)가 큰 파멸로 이어졌듯, 삶의 태도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초지일관 하기."
'대한검정회한자익히기 > 대사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검정회 대사범... 각력지희(角力之戱), 조선의 단오 씨름을 엿보다 (2) | 2025.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