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5. 19:05ㆍ대한검정회한자익히기
『대학』 「格物致知章」 해석과 현대적 의미
– 유학 고전 속 진리의 근본을 묻다

출전 소개: 『대학(大學)』이란?
『대학』은 유교의 사서(四書) 중 하나로, 본래 『예기(禮記)』의 한 편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에 의해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사서로 독립되어 후대 유학 교육의 근간이 되었지요.
『대학』은 개인 수양에서 시작하여 가정의 다스림(齊家), 나라의 통치(治國), 세상의 평화(平天下)로 확장되는 수기치인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특히 "三綱領(삼강령)"과 "八條目(팔조목)"이라는 구조를 통해 학문의 실천적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장의 위치
이 문장은 『대학』 본문 중에서도 「格物致知章」으로 알려진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格物致知(격물치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깊이 풀어내며, 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학문의 근본, 즉 ‘앎(知)의 도달’을 위한 방법론을 설파하는 매우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원문, 독음과 해석
하시니 無情者 不得盡其辭는 大畏民志니 此謂知本이니라
所謂致知在格物者는 言欲致吾之知인댄 在卽物而窮其理也라
蓋人心之靈이 莫不有知요 而天下之物이 莫不有理언마는
惟於理에 有未窮이라 故로 其知有不盡也니
是以로 大學始敎에 必使學者로 卽凡天下之物하여
莫不因其已知之理하여 而益窮之하여 以求至乎其極이니라
至於用力之久하여 而一旦에 豁然貫通焉이면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하고
而吾心之全體大用이 無不明矣리니
此謂物格이며 此謂知之至也니라
▣ 독음
하시니 무정자는 부득진기사는 대외민지니 차위지본이니라
소위치지재격물자는 언욕치오지지인댄 재물물이궁기리야라
개인심지령이 막불유지요 이천하지물이 막불유리언마는
유어리에 유미궁이라 고로 기지유부진야니
시이로 대학시교에 필사학자로 즉범천하지물하여
막불인기이지지리하여 이익궁지하여 이구지호기극이니라
지어용력지구하여 이일단에 곽연관통언이면
즉중물지표리정조 무불도하고
이오심지전체대용이 무불명의리니
차위물격이며 차위지지지야니라
▣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사를 듣는 일은 나도 남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송사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셨다.
정 없는 자가 말끝까지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백성의 뜻을 두려워함이니, 이것이 바로 ‘앎의 근본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말하는 바 ‘지식을 이룸이 사물을 격함에 있다’는 것은,
내 지식을 이루려 한다면 사물에 미루어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은 영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세상 만물에도 이치가 없는 것이 없으나,
오직 그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지식도 또한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학문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물에 접근하여,
이미 아는 이치에 근거하여 더욱 깊이 파고들게 하여
마침내 그 극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힘을 들이다가 어느 날 문득 환히 꿰뚫어 알게 되면
세상 모든 사물의 겉과 속, 정밀함과 거친 것에 다 도달하게 되고,
내 마음의 전체적인 작용과 큰 쓰임도 환히 밝아지니,
이것이 바로 사물을 격하는 것이며,
지식에 도달하는 경지라 하는 것이다.
등장 인물 소개: 공자(孔子)
이 문장에서 인용된 말씀은 공자(기원전 551년~기원전 479년)의 어록입니다. 『논어』의 “聽訟” 일화에서 따온 것으로, 공자는 송사를 잘 판단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송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 사회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여 『대학』에서는 ‘지혜의 근본’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 해설
“格物”은 ‘격식 격(格)’과 ‘사물 물(物)’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의미입니다.
“致知”는 ‘이를 치(致)’와 ‘알 지(知)’로, ‘지식에 도달함’을 뜻합니다.
“豁然貫通”은 ‘문득 환히 꿰뚫듯 이해하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어느 순간 통찰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民志”는 ‘백성의 뜻’이라는 의미로, 통치자나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유가적 통치관을 반영합니다.
“未窮”은 ‘아직 다하지 못함’을 뜻하며, 지식의 미완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현대적 의미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반복된 경험을 통해 통찰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무송(無訟)” 정신은 단지 법률적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공감 능력에서 출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윤리 교육, 인성 함양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또한 ‘豁然貫通’의 순간은 노력의 결과로 얻는 지혜의 정점이며,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배움의 자세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맺으며
『대학』의 「格物致知章」은 단순한 철학 이론을 넘어, 삶 속에서 앎과 실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배우는가’, ‘무엇을 위해 탐구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겸손하게 배우며, 끝없이 탐구하는 삶.
그 안에서 진정한 지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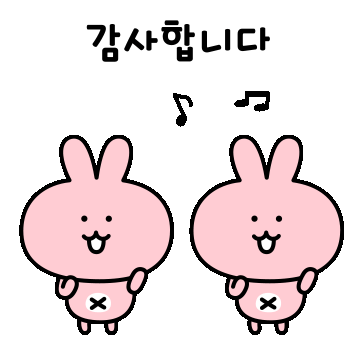
'대한검정회한자익히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검정회 대사범 - 『중용』이 가르쳐주는 중(中)과 화(和)의 길 (0) | 2025.04.28 |
|---|---|
| 대한검정회 대사범-【대학】君子의 도리와 재물의 올바른 운용법 (2) | 2025.04.28 |
| 대한검정회 대사범 –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 속 이상의(李尙毅) 이야기에서 배우는 삶의 태도 (6) | 2025.04.25 |
| 대한검정회 대사범 기출문제 ..굴원의 고뇌와 어부의 웃음" (4) | 2025.04.24 |
| 대한검정회 대사범 ...『중용장구서』에서 배우는 도통의 연속성과 전승의 책임 (1) | 2025.04.24 |